신문은 선생님
[고전 이야기] "과학과 인문학, 구분 말고 통합해야" 사회생물학의 대가 윌슨이 강조했죠
입력 : 2023.01.31 03:30
통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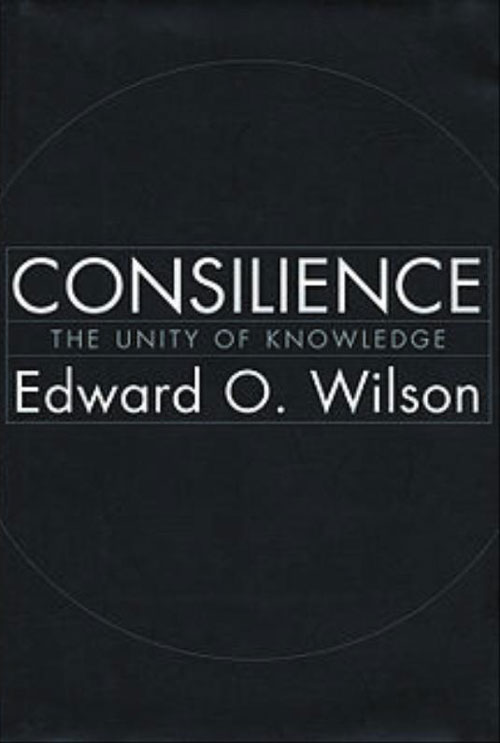
- ▲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1998년 영문 초판본 표지. /위키피디아
1998년 출간된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1929~2021)의 '통섭'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에 놓인 거대한 틈을 메워 온 저자의 노력이 집대성돼 있어요. 개미 집단을 연구한 성과로 '사회생물학'을 창시한 에드워드 윌슨은 이 책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이야말로 우리 시대 모든 학문이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하죠. 통섭(統攝·consilience)이란, 그간 학자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인위적으로 구분했던 학문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윌슨은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본래 이해는 '통합적 성격'의 것인데, 학문과 지식이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본래 의미를 잃었어요. 세상 모든 일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일어나기 마련이죠. "별의 탄생에서 사회 조직의 작동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는데, 학문마다 지나치게 높은 벽을 세우고 단편적인 해결책만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슨은 말합니다.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를 넘나들며 인과 설명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윌슨이 통섭을 강조하는 건 인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스스로 길을 개척"해 온 결과가 곧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궁극에는 우리의 미래도 "순전히 우리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학문 간 벽을 허물고 통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윌슨의 생각이에요.
자연과학은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인문학은 그러한 지식이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즉 통섭은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통섭'은 결국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과정인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