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은 내친구
'과학적 진실'도 시대에 따라 변한대요
입력 : 2013.11.04 07:48
[54]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과학이지만 현상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했죠
'천동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지동설'이 나와 명쾌히 설명하듯 관점 바뀌는 것 '과학혁명'이라 하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천동설(天動說)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것은 지동설(地動說)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지동설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대개 '과학'이라고 하면 사실과 객관적 진리,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험 결과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흔들어놓은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머스 쿤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과학이 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도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현상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과학의 영역에도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쿤은 한 시대의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렌즈로 대상을 바라보므로 과학자도 그가 사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렌즈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풀기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렌즈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지동설이 명쾌하게 설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에 대해 사람들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공통의 렌즈를 가리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옛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 '과학혁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흔들어놓은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머스 쿤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과학이 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도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현상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과학의 영역에도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쿤은 한 시대의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렌즈로 대상을 바라보므로 과학자도 그가 사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렌즈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풀기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렌즈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지동설이 명쾌하게 설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에 대해 사람들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공통의 렌즈를 가리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옛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 '과학혁명'이라고 하지요.
-
![[고전은 내친구] '과학적 진실'도 시대에 따라 변한대요](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img_dir/2013/11/03/2013110302340_0.jpg)
- ▲ /그림=이병익
2004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시가 '경제' 패러다임을 '안보'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미국인이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 변화가 대통령 선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토머스 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공부해 온 길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돕다가 과학사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됐고, 철학·심리학·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학문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그의 시각도 한층 넓어지게 됩니다.
#이야기 둘
1960년대 미국 경제를 주도한 것은 '케인스주의'였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사상에 기초한 이론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케인스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버트 루커스를 비롯해 여러 학자는 "개인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행동하므로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개인의 기대 심리와 경제 이론을 연결한 융합의 산물로 평가됐고, 루커스는 노벨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심리학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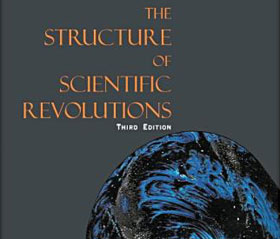
- ▲ ‘과학혁명의 구조’표지예요. 지난해는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50년이 되는 해였지요. /조선일보DB
우리가 알거나 믿고 있는 '객관적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를 이끄는 패러다임 속에서 '진실'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오늘날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하다 실패한 사례는 많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필름만 고집하다 뒤처진 회사도 그러한 예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패러다임에 적응해 살아가되 변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전 1분 퀴즈]
1. 토머스 쿤은 어떤 현상에 대해 대부분 사람이 받아들이는 공통의 렌즈를 가리켜 ( )이라고 했지요.
2. 쿤은 과학적 발전은 지식이 점차 쌓여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기존 이론이 위기에 몰리고 나서 새 이론이 등장해 바뀌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것을 과학 ( )이라고 했어요.
정답 1. 패러다임 2. 혁명
